
[아이뉴스24 김병수 기자] 마진 콜(Margin Call). 2011년 10월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다. '24시간, 조작된 진실'이란 설명이 붙어있다.
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파산한 리먼 브러더스가 모티브다. 당시 리먼은 한국산업은행·한국투자공사(KIC)·하나금융지주에 리먼 지분 20%를 사달라고 타진했다. 산업은행은 리먼의 경영권을 확보하자는 계획까지 세우고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했다.
10년 전, 국제통화기금(IMF) 외환위기로 국내 5대 은행 모두 간판을 내리고, 은행들을 외국 자본에 넘겼던 대한민국이다. 글로벌 투자은행을 우리가 살 수도 있다는 보도에 만감이 교차하던 때다. 그러나 이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.
2000년 9월.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이 당시 한미은행의 대주주가 됐다. 마이클 병주 킴이라는 사람이 칼라일 아시아 회장 명함을 들고 전면에 등장했다. 현 MBK 회장 김병주다. 이를 계기로 번듯한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국내 M&A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올랐다.
김 회장은 한미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3년 6개월 만에 미국 씨티은행에 되팔았다. 김 회장의 국내 첫 작품은 해피엔딩이었다. 그리고 명함을 새로 팠다. 자신의 이름으로 새긴 MBK 깃발을 들고 칼라일에서 독립했다.
"서구 모델과 다른 아시아 자본주의 발전을 고려한 사모펀드(PEF)를 실현하겠다." 당시 김 회장의 유명한 말이다.
서구와 다른 사회·문화인만큼 서구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긴 쉽지 않다고도 했다. 그렇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M&A 시장에 추파를 던졌다. '아시아 사모펀드론'이다.
김 회장은 서구에선 흔한 차입 레버리지를 활용한 PEF 운용과는 다른 방식이라고도 했다. 아시아의 적지 않은 나라에서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서 하이에나 같은 서구 사모펀드(벌처펀드)에 반감이 컸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했다.
그동안 김 회장은 국내에서 꾸준한 성과를 냈다. 빅딜을 연이어 체결하며 승승장구했다. 글로벌 금융 위기로 주가는 곤두박질쳤고, 글로벌 양적 완화로 레버리지(차입거래) 환경은 더 좋아졌다.
이 과정에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봤던 인정사정없는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는 피했다. 운용자산 40조원을 넘어서며 동아시아 최대 규모로 성장한 배경이다.
한미캐피탈(현 KB캐피탈)을 시작으로 KT렌탈, 딜라이브(옛 씨앤앰), 코웨이, 두산공작기계, 홈플러스, 오렌지라이프(옛 ING생명, 현 신한라이프), 롯데카드 등을 차례로 인수했다.
그러나 이것이 김 회장이 밝힌 사모펀드 운영 방식에 따른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. 최근엔 타깃이 재벌급 회사로 옮겨졌다. 2023년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와 2024년 고려아연-영풍 분쟁에 연이어 참전한 것이 그렇다.
이런 와중에 홈플러스 법정관리가 터졌다. 법정관리가 가져올 파장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. 이미 보유 점포들을 매각 후 재임대(세일앤리스백) 방식으로 투입비용을 대부분 회수했다. 채무자는 MBK가 아닌 홈플러스다.
금융시장에선 사모펀드의 전형적인 출구(exit) 전략으로 회생 신청을 했다고 꼬집는다.
최근 고려아연-영풍 분쟁 과정에서 스텝이 꼬인 MBK가 유동성 타개를 위해 홈플러스를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는 얘기도 나온다.
어쨌든 김 회장의 행보는 아시아의 정서와 문화를 고려한 '아시아 사모펀드론'과는 거리가 있다. 오히려 김 회장에게 가장 익숙한 칼라일을 비롯한 서구 사모펀드의 하이에나에 가까워졌다.
이제 김 회장에게도 '마진 콜'이 울렸는지도 모른다. 마진 콜은 증거금이 모자랄 때 선물회사나 증권회사로부터 증거금의 부족분을 보전하라는 전화(call)를 받는다'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.
마진 콜은 늘 위기와 함께한다. 2011년 영화처럼…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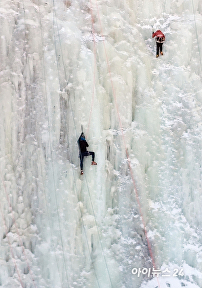
--comment--
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.
댓글 바로가기